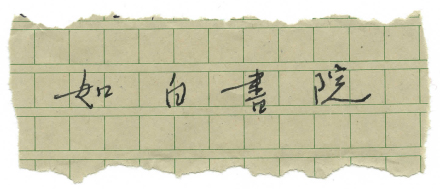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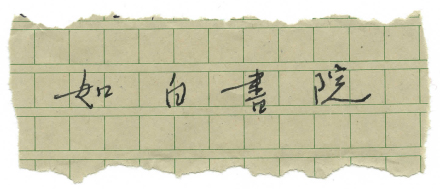
如白書院─
그 이름이 하도 황홀해서 여주시 걸은리에 갓 지어진 한옥 서원이라는 것, 독문학자 전영애 교수가 그 원장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찾아보기로 했다. 가을 단풍도 즐길 겸 문혜와 함께 여주로 떠났다. 우리 집 퇴촌에서 멀지 않은 양평에서 여주까지 새로 뚫린 고속도로는 어쩌다 만나는 차가 반가울 만큼 한가롭기 그지없다. 차적(車跡)도 드문 이 숨겨진 비도(秘道)는 그 풍치가 가히 Parkway급이어서 길을 사랑하거나 드라이빙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놓치기 어려운 곳이다.
그런데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걸은리가 의외로 꼭꼭 숨어 있었다. 걸은리는 한 곳이 아니라 1리, 2리, 3리가 뚜욱 뚝 떨어져 있는데다, 주민들도 갓 지어진 그 서원을 아는 이가 별로 없어 이곳저곳 찾다보니 굽이굽이 휘도는 오르막길에 접어들어 미지의 땅, 미궁의 수렁인가 싶은 낯선 곳이 나타났다. 여주에도 이렇듯 깊은 오지가 있었다니……. 그 신비로운 비경(秘境)에 한참 취해 있다가 여백서원을 다시 찾았다. 그러다가 꼬박 한 나절을 헤매고 나서야 가까스로 찾을 수 있었다.
나무들이 빼꼭히 차있는 산자락에 고즈넉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서원에 주인은 보이지 않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주인은 저 숲속에 약초라도 캐러 간 것일까? 동자(童子)라도 있으면 묻기나 하겠지만, 적막이 표표한 뒷산에는 그저 구름만 한가롭다. 이 또한 여백(如白)이 아닌가.
여백(餘白)의 아름다움에만 홀려 있었을 뿐, 여백(餘白)이 흼과 같은, 흼으로 가득한 여백(如白)임을 나는 알지 못했다. 주인 없는 빈 뜰을 한참 서성거리다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전 원장의 친지 몇 사람이 찾아와 나그네들끼리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 뒷산에는 올라 보셨나요?
그중 한 분이 산으로 트인 오솔길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 웬걸요. 오를까 말까 망설이기만 했지요.
─ 한번 가 볼만 해요. 이 서원에 딸린 숲이 3천여 평인데, 정자를 지나 한 참 오르면 전망대가 보입니다. 앞이 툭 티어 시원하지요.
그 권유에 따라 전망대에 오르기로 했다. 숲속으로 뚫린 오솔길을 따라 걷고 있노라니, 풍진세상(風塵世上)이 지척인데도, 깊은 정적 속으로 빠져든다. 내가 걷고 있는 곳은 어느 새 샤르트뢰즈 산맥의 깊은 계곡, 라 그랑드 샤르트뢰즈 수도원(Grande Chartreuse)으로 향하는 정적의 숲길이었다.

위대한 침묵 속으로
알프스의 프랑스 자락인 샤르트뢰즈 산속에 움츠리고 있는 그랑드 샤르트뢰즈 수도원은 쾰른의 은자(隱者) 성 브루노(St Bruno)가 1084년에 창설한 이래 정적에 싸여있었다. 정적 속에 깊이 묻혀있었던 그 수도원의 모습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그뢰닝(Philinp Grὃninɠ)감독의 <위대한 침묵속으로>라는 기록영화를 통해서였다. 브루노 신부가 카르투지오 회(Carthusian Order)의 수도원을 이곳에 창설한 이래, 은자(隱者)들의 성지로 굳어져, 정적에 파묻힌 그 은지(隱地)의 아우라를 화면에 담아 보려고 그뢰닝은 기록영화를 촬영할 수 없겠느냐고 수도원에 문의한 적이 있었다. 1984년의 일이다. 그러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정적을 기록하기 위해 정적을 깨는 일이었으므로.
그로부터 16년이 지나서 그뢰닝 감독에게 연락이 왔다. 아직도 그럴 생각이 있다면 촬영해도 무방하다는 통보였다. 그뢰닝 감독은 단 한 사람의 스태프도 대동하지 않고 아무런 조명기구도 없이 달랑 흑백 촬영기 하나만 둘러메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 후 몇 차례에 걸쳐 총 6개월 동안 촬영한 내용이 2년간의 편집을 거쳐 마침내 2시간 45분의 기록영화로 탄생했다.
세 시간 가량의 흑백화면은 정적으로 채워진다. <위대한 침묵속으로>
(원래의 이름은 <위대한 침묵> Die Grosse Stille, La Grande Silence였으나 이 필름이 영어권에서 배포될 때 <위대한 침묵속으로> Into Great Silence로 바뀌었다)는 내레이션이나 인터뷰는 커녕, 배경음악조차 없다. 정적으로 가득 찬 그 화면에서 들리는 소리라고는 수도승들이 복도나 눈 위를 걷는 발자국 소리, 장작 패는 소리,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 마루가 울리는 소리, 눈이 소리 없이 내리는 소리,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수도승들이 부르는 그레고리오 성가 (Gregorian Chant) 뿐이다. 그리고 그 성가 또한 정적의 여백(如白)이다.
‘소란스러움이 없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정적은 아니다’고 피카르트는 말한다. 그는 ‘정적의 깊이’에 대해 거듭 이야기하지만 ‘정적의 무게’ ‘정적의 격(格)’을 그 ‘깊이’속에 포함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깊고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있는 샤르트뢰즈, 이곳이야 말로 피카르트(Max Picard 1888-1965)의 책 「침묵의 세계」(Die Welt des Schweigens)가 태어났음직한 곳이다.

이 정적을 화면에 담으면서 그뢰닝은 이런 말을 했다. “언어가 물러날 때만 우리는 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완전한 침묵 속에서만 우리는 듣기 시작 한다”고.
침묵의 의식(儀式)을 거치고 나서야 열리는 입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충분히 음미할 줄 모른다. 언어는 정적과 침묵 속에서 태어날 때만 아름답거늘─
어찌 언어뿐이랴.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는 누구일까? 그리스 사람들은 아프로디테를 선택했다. 끊임없이 바다에서 목욕을 하기 때문이다. 아프로디테는 수없이 처녀를 잃어도 목욕만 하고 나면 다시 처녀를 말끔히 회복한다는 것이다. 목욕의 마력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지상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여인상을 어떤 이는 그 미소가 수수께끼 같은 모나리자라고 우기지만, 어떤 이는 보티첼리가 그리스의 화가 아펠레스한테서 영감을 얻어 그린 비너스라고 우긴다. ‘바다에서 목욕을 하고 솟아오른 비너스’(Venus Anadyomene)의 표기상이기 때문이다.
비너스가 아름다운 것은 끊임없이 목욕을 하기 때문이라면 정적과 침묵 속에서 마음과 몸을 씻는 묵욕(黙浴)은 어떨까? 끊임없이 묵욕으로 범속성(vulgarity, Banality)을 씻어내는 여인이라면 ─가령 스땅달의 끌렐리아 같은 여인이라면─ 그 아름다움이 아프로디테보다 못할 리 없다.

언어 또한 정적에서 태어날 때만 아름답다. 인간의 혀끝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 청산유수 같은 달변은 구데기가 득실거리고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시궁창일 때가 더욱 많다.
샤르트뢰즈의 깊은 산 속에서 묵욕에 푹 빠져있자니 어느새 여백서원 변방의 전망대에 이르렀다. 그랑드 샤르트뢰즈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는 이제르(Isere) 계곡의 절경에 비길 수는 없다 해도 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툭 트인 광활한 공간 너머로 그림처럼 펼쳐진 산과 들. 그 속에 가득 찬 정적, 그 정한(靜閑)의 아타락시아(ataraxia), 그 여백의 아름다움이 어찌 샤르트뢰즈만 못하랴.
주인의 모습은 저 멀리 어른거릴 뿐, 주인이 자리를 비운 텅 빈 숲은 여전히 여백이다. 그 속에서, 만난 적도 없는 주인을 생각하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이게 뉘 숲인지 나는 알겠네. (Whose woods these are, I think I know.)
이 인적 없는 숲에 눈이 내릴 때 나는 다시 이 숲을 찾을 것이다. 프로스트(Robert Frost)의 시(Stopping by Woods on Snowy Evening)를 읊기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