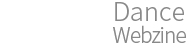리뷰
국립정동극장 세실에서 4월 10일부터 24일까지 ‘독각(獨覺) 그리고 득무(得舞) - 우리 시대의 전통춤’이라는 타이틀의 공연이 5회에 걸쳐 있었다. 국립정동극장(대표이사 정성숙)이 3년째 진행하는 기획으로, 2023년에 ‘세실풍류 - 세실의 전통 이야기’, 2024년에 ‘법고창신 – 근현대춤 백년의 여정’에 이어지는 무대이다. 독각(獨覺) 후에 득무(得舞)에 이르러 자신만의 독창적인 전통춤을 고민하는 전통춤꾼들을 한 무대에서 선보이자는 기획 의도가 참으로 당(當)시대적이다. 또한 서울의 도심 중앙에서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관객을 소화하고 있는 정동극장에 어울리는 기획이었다.
그런데 이 기획이 의도한 ‘오늘의 새로운 전통춤’은 이미 진행형이다. 전통춤을 딛고, 또는 자산으로 한 새로운 전통춤이 즉 신전통춤들이 이미 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춤이란 전통의 시대에 왕정과 농업공동체를 토대로 추어지던 춤을 말한다. 근현대로 접어들며 그러한 토대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전통춤은 새로운 환경에서 추어지며 서서히 변신했다. 이 과정 중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된 한국 창작춤은 현대무용과 함께 창작춤 즉 컨템퍼러리 댄스라는 궤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다른 경로와 지향으로 추어지는 신전통춤은 현재의 극장 무대와 공연 환경에서 현재적 감수성을 기반하여 추어지고 있는 것이다.
신전통춤은 전통춤의 기법을 그대로 구사한다. 마치 발레가 발레의 고유한 기법으로 추어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전통춤의 호흡과 굴신, 국악의 장단과 선율, 의상과 소품 등을 그대로 연행(演行)한다. 여기에 새로운 동선과 인원 구성, 조명과 이미지 등이 추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새로운 표현 욕구와 색다른 정조(情調)가 새로운 전통춤을 발동(發動)시키고 있는 것이다. 발동시킨 지 이미 오래이며, 전통시대의 전통춤이 아닌 것이다.
필자는 양일의 공연을 관람했다. 15일의 ‘득무, 깨달음의 몸짓 - 폭포수 물보라의 무지개’에서 오상아(창원시립무용단 예술감독)의 〈香(향)〉, 임성옥(김백봉부채춤보존회 회장)의 〈홀연〉, 김용복(사)한국춤협회 부이사장)의 〈무자산야(舞者散也), 이주희(중앙대학교 교수)의 〈춘장고무(春長鼓舞)〉, 김수현(김수현춤벗Culture 대표)의 〈소무소무(素舞笑舞)〉, 이순림(국가무형유산 태평무 처용무 이수자)의 〈진혼입춤〉이 추어졌고, 17일에는 ‘새로 만발하는 전통춤 - 꽃봉오리가 피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서정숙(푸른가지 대표)의 〈상춘도량(常春道場)〉, 권영심(사)한국전통춤연구회 이사장)의 〈담소풍(淡笑風)〉, 김현아(서울예술단 수석)의 〈동발무〉, 이희자(리을무용단 단장)의 〈마중〉, 염복리(예담Y 예술감독)의 〈揮(휘)〉, 권명주(권명주느루무용단 예술감독)의 〈질굿 소고〉가 공연되었다.


|
오상아 〈香〉, 권영심 〈담소풍〉 ⓒ국립정동극장, 옥상훈 |


|
김용복 〈무자산야〉, 염복리 〈휘(揮)〉 ⓒ국립정동극장, 옥상훈 |
12작품은 전통춤의 재구성 내지 창의(創意)를 가미한 정도나 측면에서 여러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새로운 전통춤을 바라보는 각 춤꾼의 관점이나 접근 방향에 편차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통춤의 종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산조춤 계열로 3편이 추어졌다. 오상아의 〈香〉은 가야금 산조로, 김용복의 〈무자산야〉와 염복리의 〈휘(揮)〉는 거문고 산조를 음악으로 사용했다. 권영심의 〈담소풍〉은 입춤 계열의 작품으로, 스승 임이조와 이매방의 스타일이 농후했으며, 농익은 춤 맵시를 보여주었다.

|
임성옥 〈홀연〉 ⓒ국립정동극장, 옥상훈 |
임성옥의 〈홀연〉은 살풀이춤 계열로, 짙은 치마저고리에 흰 수건을 들고 춤추었다. 중앙에 곱게 포개진 수건을 엎드렸다가 집어 올린 후 무대 뒤편에서 서서히 춤이 시작되었다. 길지 않은 수건을 목에 걸치고 양손으로 잡아 같이 뿌리거나 엇갈려 뿌리다가 손춤을 추었다. 자진모리에서 사방치기를 하듯 돌며 수건을 멀리 뿌렸다가 채기를 반복하고, 머리 위에서 수건을 흩뿌려 휘감는 대목이 이 살풀이춤의 절정이다. 한을 딛고 풀어낸다는 살풀이춤의 핵심이 표현되었다. 정주와 구음, 장고 장단만으로 반주했는데, 간결한 악기 구성이 춤꾼에 더욱 집중하게 했다. 중량감 있는 체구와 깊은 호흡, 자잘하지 않은 발 디딤, 그리고 간결한 동선 등이 깊고 묵직한 살풀이춤으로 표현되었다. 기존의 살풀이춤과는 다른 질감과 스타일이었고, 어둠 속에서 뿌려지는 흰 수건은 오히려 살풀이를 선명하게 드러냈다.

|
이주희 〈춘장고무〉 ⓒ국립정동극장, 옥상훈 |

|
김현아 〈동발무〉 ⓒ국립정동극장, 옥상훈 |
그리고 이주희의 〈춘장고무〉는 신무용 장고춤과 설장고를 자연스럽게 접목하였고, 장단과 춤이 똑똑 떨어지며 흥을 일으켰다. 김현아의 〈동발무〉는 바라춤을 소재로 작품화하여, 작은 바라를 들고 춤추었다. 사물과 피리, 태평소를 반주로 하여, 칠채–자진모리-동살풀이-휘몰이 장단의 변화에 따라 바라춤의 동작을 다양하게 구사했다. 시각적 청각적으로 화려한 신명을 보여주었다.

|
이순림 〈진혼입춤〉 ⓒ국립정동극장, 옥상훈 |

|
서정숙 〈상춘도량〉 ⓒ국립정동극장, 옥상훈 |

|
권명주 〈질굿 소고〉 ⓒ국립정동극장, 옥상훈 |
창의(創意)를 좀 더 적극적으로 구사한 작품들도 있었다. 이순림의 〈진혼입춤〉은 신칼대신무의 신칼을 사용했으며, 병자호란에서 희생된 영혼을 달래고 기린다는 설정으로 구성되었다. 입춤으로 손춤을 상당히 추다가 신칼을 들었는데, 신칼이 무대 규모에 비해 좀 컸다. 그런데 서로 다른 결의 의상, 소품, 춤사위를 결합시키고자 했고, 전라도 씻김굿의 음악까지 더해지면서 관통하는 결 내지 스타일이 쉽게 잡히지 않았다. 서정숙의 〈상춘도량〉은 승무를 색다르게 접근한 작품으로, 소리꾼 김보라(푸른가지 음악감독)와 협업 작업이었다. 소리와 춤이 무대를 집중시켰으나, ‘상춘(常春)’의 모티프가 충분히 구현되었는지는 의문이었다. 물 소리, 풍경 소리는 고즈넉한 산사(山寺)의 느낌이었고, 법고 대목 후 급하게 결말을 지은 듯했다. 권명주의 〈질굿 소고〉는 고깔소고춤의 기법과 소재를 바탕으로, 농악에서 질굿의 과정을 인생사에 비추어 구성한 작품이었다. 후반 삼채장단에서 농악 반주와 함께 흐드러지게 춤추면서 17일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했다.

|
이희자 〈마중〉 ⓒ국립정동극장, 옥상훈 |

|
김수현 〈소무소무〉 ⓒ국립정동극장, 옥상훈 |
더 나아가서, 특정한 전통춤 종목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접근이 아니라, 창작 아이디어를 설정하고, 전통 춤사위로 춤을 구성한 작품도 있었다. 이희자의 〈마중〉은 망부석(望夫石)을 모티프로 하여 단아한 여인의 모습으로 내적 스토리를 그렸다. 그리고 춤이 단단하고 몰입이 탁월한 김수현은 〈소무소무〉를 추었다. 한 줄기 바람을 맞으며 걸음을 딛거나, 양산을 쓰고 소박하게 나들이를 즐기는 창작 작품이었다.
이틀 간의 공연에서 선보인 작품 제목들을 보면 전통춤 각 종목의 원래 제목은 없었다. 즉 기존의 전통춤 각 종목에 다양한 컨셉을 얹혔으며, 전통춤꾼 저마다 전통춤의 재구성 내지 해석에 대한 독창성, 예술적 지향을 담아냈다고 하겠다. 국립정동극장의 기획 의도에 적합한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전통춤 공연이었다. 그 다양한 스펙트럼이 관객으로 하여금 색다른 미적 쾌감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김영희
전통춤이론가. 김영희춤연구소 소장. 역사학과 무용학을 전공했고, 근대 기생의 활동을 중심으로 근현대 한국춤의 현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 『개화기 대중예술의 꽃 기생』, 『전통춤평론집 춤풍경』등을 발간했고, 『한국춤통사』, 『검무 연구』를 공동저술했다. 전통춤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중시하며, ‘검무전(劍舞展)I~IV’시리즈를 기획했고, '소고小鼓 놀음'시리즈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