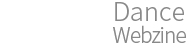리뷰
차가운 봄, 국립부산국악원무용단(예술감독: 복미경)의 신작 〈선락, 기억의 산으로〉가 관객을 만났다(3월28일-29일). 지역민의 애호 속에 발표된 작품은 신라에 기원을 둔 상염무(霜髥舞), 무애무(無㝵舞), 검기무(劍器舞), 사선무(四仙舞), 선유락(船遊樂)을 소개한다. 그리고 관련인물(사선랑, 헌강왕, 산신, 원효, 의상)을 등장시켜 그 내력을 설명하기도 한다.
프롤로그의 시작과 함께, 옛 신라의 연못 월지(月池)가 펼쳐진다. 바닥은 물결 마냥 일렁이고, 옛 화첩에서 볼 법한 산들이 첩첩히 드리워져 있다. 멀리 조각배 하나가 떠 있고, 빛나는 금관 앞에 한 사내가 서있다. 갈색 베일을 쓴 여인들이 이리저리 너울거리고, 풍류도 ‧ 화랑도 ‧음성서(音聲署)를 설명하는 긴 내레이션이 장엄하게 이어진다. 저 멀리 어슴푸레 등장한 화랑 넷이 조그마한 배에 몸을 싣는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 기억 속 옛 춤을 찾아가는 뱃놀이의 시작을 알리는 듯하다.

|
국립부산국악원무용단 〈선락, 기억의 산으로〉 ⓒ국립부산국악원, 라운드테이블 이진환 |
1장은 오늘날 전승되지 않는 상염무를 모티브로 한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 헌강왕(860-886)이 포석정에 행차했다. 그런데 산신(南山神, 御舞山神)이 나타나 춤을 추었다. 좌우 신하는 모두 보지 못했고, 오직 왕만이 그 춤을 보았으며, 온전히 모방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 왕이 춘 산신의 춤, 그것이 상염무라는 것이다. 인간이 재현한 산신의 춤은 어떤 모습일까? 더욱이 왕이 무당처럼 접신(接神)하여 춘 상염무는 어떤 것일까?
작품은 이 같은 물음에 답하지 않는다. 다만, 기원과 관련된 내용을 영상을 통해 자세히 소개한다. 그리고 산신이 등장한다. 빛을 뚫고 나오는 그는, 백발의 아름답고 가녀린 여신의 모습이다. 금관 앞의 사내는 헌강왕인 듯하고, 둘의 대무(對舞)가 시작된다. 현행 정재의 한 장면을 옮겨온 듯, 상대(相對)와 상배(相背)를 진중하게 반복한다. 마침내 금관 앞에 나란히 선 둘은 첩첩히 드리워진 산을 향해 걸어가고, 어둠 속에 자취를 감춘다.


|
국립부산국악원무용단 〈선락, 기억의 산으로〉 ⓒ국립부산국악원, 라운드테이블 이진환 |
2장은 무애무다. 이 춤은 원효스님(617-686)이 불교 포교를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교무용의 한 갈래인 이것은 엄숙한 춤인가? 그렇지는 않다. 광대들이 가지고 노는 큰 바가지나 목이 굽은 조롱박을 무애(無㝵)라 하고, 이를 어루만지거나 두드리며 추는 춤이다. 또한 삼국통일전쟁의 난세 속에 천민과 어울러 춘 거리의 춤이었으며, 어려운 말이 아니라 몸으로 부처의 가르침을 직관케 한 춤이다. 고려 때까지 민간에서 널리 유통되었고, 궁중무용으로도 정착했다. 오늘날 전해지는 무애무는 조선후기 효명세자(1809~1830)가 아버지 순조의 무병장수를 위해 재창작한 것으로, 무애를 변주한 호로병을 사용하지만, 거리 춤의 흔적은 희미하다.
작품은 승복 입은 원효와 의상을 등장시킨다. 그리고 주고받는 대사를 통해 유명한 일화를 소개한다. 그 요지는, 맛있게 먹었던 물이 알고 보니 해골 물이어서 구토를 했다. 원효는 이 같은 경험을 통해 모든 일에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一切唯心造)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후 결혼과 파계 전 과정이 내레이션을 통해 자세히 설명되고, 정재 무애무가 아정하게 이어진다.


|
국립부산국악원무용단 〈선락, 기억의 산으로〉 ⓒ국립부산국악원, 라운드테이블 이진환 |
3장은 검기무다. 이 땅에서 칼을 사용하는 춤은 매우 다양하다. 지방 교방청(敎坊廳) 소속 여기들에 의해 연희된 진주검무 ‧ 통영검무 ‧ 평양검무가 대표적이다. 조선후기 민간에서 대단히 유행한 여기검무는 궁중으로 유입되고, 왕조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칼춤으로 재편되었다. 이것이 정재 검기무이다. 이 외에도 종교의례이자 수련방식으로 사용된 칼 노래 칼춤(劍訣), 사형 집행 시 죄인의 목을 베던 망나니의 칼춤, 상여(喪輿) 앞에서 탈을 쓰고 잡신을 물리치는 칼춤이 있다.
이 모든 검무의 기원으로 지목되는 것은 황창검무(黃倡劍舞)이다. 『동경잡기』는, 신라의 어린 소년 황창이 칼춤을 추며 백제왕을 죽였다. 이후 죽임 당한 소년을 가엾게 여긴 신라인들이 그의 형상을 본떠 가면을 만들고 칼춤을 추었다 한다. 이 춤이 황창검무인데, 비극적인 이야기와 달리 희극적인 아기동자가면 칼춤이었으며, 민간의 애호 속에 오랜 동안 지속되었다.
작품은 정재 검기무를 재현하지 않는다. 대신 내레이션을 통해 황창검무를 자세히 소개한다. 이어 화랑 무리의 화려한 칼싸움이 전개된다. 격투장을 연상시키는 사각 프레임에서 펼쳐지는 몸짓은 조선시대 군사용 무술교본 『무예도보통지』에 기초한 창작이다. 둘의 대련은 여덟이 되고, 장중한 북소리와 함께 더 많은 인원이 나와 칼을 겨눈다. 말미에 장중한 내레이션을 통해 검기무가 충(忠)을 강조하는 화랑도 정신의 계승이라고 설명한다.


|
국립부산국악원무용단 〈선락, 기억의 산으로〉 ⓒ국립부산국악원, 라운드테이블 이진환 |
4장은 사선무다. 효명세자가 창작한 여러 정재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신라를 대표하는 네 명의 화랑이 신선이 되었다. 이들이 조선 왕실에 다시 와서 놀만큼 태평성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품은 정재를 재현하기에 앞서, 월지에서 배를 타고 떠난 네 화랑을 불러들인다. 사선무의 모티브인 네 명의 신선이 된 화랑, 즉 사선랑(四仙郞)이 이들인 것이다. 그리고 용(龍) ‧ 봉황(鳳) ‧ 코끼리(象) ‧ 말(馬) 가면을 쓴 자들이 무대를 휘젓고 다닌다. 이윽고 신라풍의 복식을 한 여인들이 주르르 나타나 사선무를 시현한다. 가면은 대형과 대형 사이를 오가고, 사선랑은 구경을 하는 듯 여기저기를 옮겨 다닌다. 다소 어수선한 춤이 마무리 되면, 프롤로그의 조그마한 배가 무대 중앙으로 옮겨진다.


|
국립부산국악원무용단 〈선락, 기억의 산으로〉 ⓒ국립부산국악원, 라운드테이블 이진환 |
5장은 선유락이다. 뱃놀이의 일종인 이 춤은, 검기무와 유사하게 민간에서 성행하다가 궁중에 편입된 사례이다. 정조19년(1795) 혜경궁 홍씨 회갑연에서 처음 연희되었다. 이 행사 전체를 면밀히 기록하고 있는 『원행을묘정리의궤』는 선유락이 신라 때부터 있었다고 전한다.
작품은 배를 에워싸고 어부사를 부르는 정재 선유락을 재현한다. 국립부산국악원의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인 이것은, 군관(軍官)의 힘찬 호령에 따라 행선준비(行船準備), 행선(行船), 퇴장(退場)의 순으로 진행된다. 하이라이트는 배가 바다로 나가는 행선이다. 배 주변에 화려하게 늘어진 줄을 잡고, 빙글빙글 회무하며 노래하는 것이다. 라이브로 연주되는 나(螺), 징, 나발, 태평소 소리가 청량감을 선사하며 울러 퍼지고, 또 다시 등장한 사선랑에게 인사하고 전원 퇴장한다.

|
국립부산국악원무용단 〈선락, 기억의 산으로〉 ⓒ국립부산국악원, 라운드테이블 이진환 |
마지막 에필로그이다. 사선랑은 배 앞에 서 있고, 백발의 산신과 조우한다. 이들은 별다른 액션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반딧불을 든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 밤하늘 별빛처럼 어둠을 밝힌다. 옛 춤을 찾아 떠난 뱃놀이 선락(船樂)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소개된 다섯 춤 중에서, 상염무와 사선무는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 되거나, 애초에 정재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전승양상이 비교적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민간에서 궁중으로 유입된 무애무 ‧ 검기무 ‧ 선유락은 민간전승과 궁중전승이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전개 과정이 복잡하고, 춤의 성격 또한 제각각이다. 때문에 무애무 ‧ 검기무 ‧ 선유락은 보다 폭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작품 〈선락, 기억의 산으로〉는 전승의 다면적 모습을 고려하기보다, 정재에 방점을 두고 재현하거나 창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애무와 사선무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 보유자 이흥구에게 이습(肄習)한 것이고, 선유락은 국립부산국악원의 레퍼토리로 이미 여러 번 재현한 것이다. 그리고 창작한 상염무와 검기무는 기존 정재의 대무 방식을 원용하거나, 정재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왕조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궁중무용의 또 다른 이름인 정재는 우리 문화의 중요한 유산이다. 특히 아름다운 노래 말은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군더더기 없이 정갈하게 이어지는 몸짓은 우리 춤의 또 다른 미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전정(前庭)에서 펼쳐지는 대형은 동양의 보편적 사상을 탐구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17세기 초입의 여러 전란(戰亂)과 근대 식민지를 거치면서 정재의 많은 부분이 일관되게 전승되지 못했고, 단절과 복원의 과정을 거쳤다. 소개된 다수의 춤 역시 옛 문헌에 기초하여 복원된 것이다.
기록에 의존하여 정재를 복원할 때 나서는 문제점은 춤의 전체적인 윤곽, 대형, 노랫말 등은 알 수 있지만, 움직임과 같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때문에 복원된 정재의 형식이 지나치게 단조롭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아울러 몇몇 곡에 편중된 반주음악은 정재를 보다 식상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작품이 재현하고 창작한 춤들은 이 같은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듯하다.
한편, 작품은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선랑(四仙郞)을 등장시켜, 옛 춤을 찾아 떠나는 뱃놀이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그리고 내레이션 ‧ 영상 ‧ 대사를 통해 춤의 기원 및 관련 일화를 자세히 소개한다. 이 같은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모호한 액션과 빈약한 춤은 되레 혼선을 초래했으며, 길고 빈번한 내레이션은 몰입과 상상을 저해한 측면이 있다 하겠다.
전통은 오랜 시간 동안 기억되고 전수되는 것이다. 때론 긍정적으로 계승되어 그 모습을 온건하게 이어가기도 한다. 또 당대적 이해와 비판을 수렴하며 부정적으로 계승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계승은 본질적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전형(典型)을 공유한다. 기억 속 옛 춤을 소환하는 〈선락, 기억의 산으로〉는 이것을 온전히 담고 있는가? 지속적인 고민과 탐색이 필요해 보인다.
송성아
춤이론가. 무용학과 미학을 전공하였고, 한국전통춤 형식의 체계적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저서로 『한국전통춤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한국전통춤 구조의 체계적 범주와 그 예시』(2016)가 있다. 현재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있다.